경찰임무수행중 사고로 7년간 식물인간 투병 끝 사망.... 보훈처는 순직자 인정 거절, 法 "순직 인정해야"
1.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관 A(1963년생)는 198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으로 일하다가 2013년 12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정리를 위해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도로에서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졌다.
A는 이후 2016년 11월에 퇴직처리 되었다.
A의 가족은 2017년 6월에 보훈처에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2017년 12월에 A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이후 A는 7년간 식물인간상태로 있다가 2020년 2월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이에 대해 보훈처에게 국가유공자인 A를 순직군경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보훈처는 A의 경우가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발, 보훈처의 거절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2. 재판
원고 유족 측의 논리는 이렇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망의 시기가 퇴직 이후라고 하더라도 순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 보훈처측의 논리는 이렇다. 쟁점이 되는 해당 순직군경이 되려면 법률조항 해석상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A는 퇴직한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그 이후에 사망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1심(청주지방법원) - 원고 승소 판결. A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것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A를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 보통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질병이 발생한 시기와 사망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해당 법률조항의 의미는 사망의 시기가 직무수행중일 때가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직무수행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해당 법률조항은 몇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순직군경의 인정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
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이라는 문구는 사망 당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 당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으로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현행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에 의하면 순직자의 등록신청은 공상 등 다른 등록신청과 분명히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다.
-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직무수행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후에 순직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심히 부당한 주장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 해당 법률조항이 개정된 것은 순직군경의 요건이 사망의 시점이 퇴직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따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확립된 이후 이에 혼란을 부분을 삭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요한 것은 사망의 발생 시기가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직무수행이다.
- 사망 시기가 퇴직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보호해야 할 대상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법률조항이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에 어긋나고, '저렇게' 해석하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렇게’ 해석하여야 한다.
등을 이유로 해당 법률조항이 사망 당시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퇴직 및 전역 이후 그 피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보훈처는 항소했다.
2.) 2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항소 기각. A를 순직자로 인정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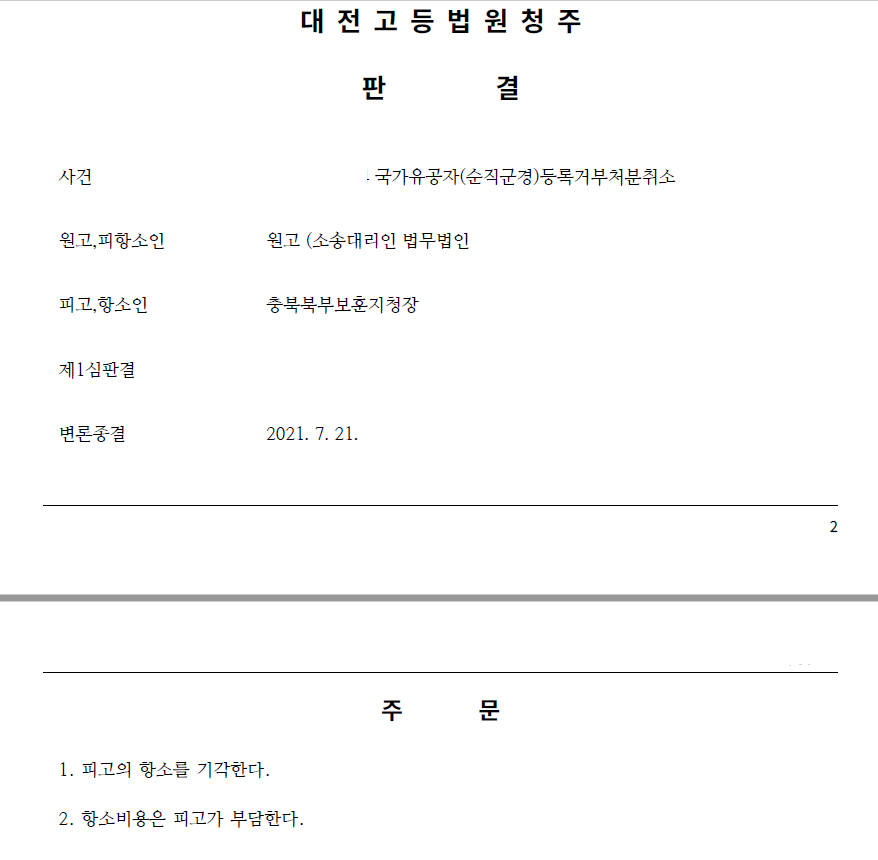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후 보훈처는 상고를 포기했다. 판결은 이렇게 확정되었다.